아이마다~
인문학 인문학 하지 말고 집안 족보나 좀 파바라~
매형에게는 애말이요~나에게는 아이마다~그렇게 부르는 고흥 큰누님 말대로, 요즘에는 직장을 파하고 집에 일찍 들어가 족보를 파본다.
집밥을 남도 파김치에 먹고 족보를 파서 본다. 파먹고 파먹는 맛이 개미지다. 수백년 족보를 파는 일은 수월치 않으니 솔찬한 일이다. <전라도 말에 뿌리>에는 '솔찬하다' 어근은 '수월치 않다'에 뿌리가 있다고 말한다.
표지 그림처럼 산넘어 산이다.

말에 뿌리가 있듯 혈통에도 뿌리가 있다.
족보다.
족보에 흐르는 남도에 역사도 모름시롱 서양철학을 들먹시면 누님 말대로 '헛똑똑이'가 된다.
그렇다.
인문학은 일부 학자나 교수나 작가들이 강단에서만 향유하는 헛똑똑이 학문이 아니다. 사람(人)의 문학이요, 사람(人) 간 (間)에 나누는 人間이 함께 공유하고 공감할 만한 문학이다.
함께 살며 숲과 산을 이루는 <나무, 인문학으로 읽다>는 책도 관심이 간다. 나무에게 인생길을 묻는 책이다.

나도 한 때는 주식이나 부동산 헛것에 눈먼 때가 있었다.
눈먼 돌문였다.
아니 그보다 욕심으로 털어내지 못하는 고집세고 옹졸한 조팝나무였다고 해야 할까

헛똑똑이에 눈먼 돌문어가 되지 않으려 요즘에는 집안 족보 글을 썼다. <족보에 역사는 흐른다> 족보로 떠나는 남도인문학 여행 시리즈 편으로 6편까지 물 흐르듯 써 내려갔다.
파면 팔수록 족보는 뿌리깊은 나무였다.

나대용, 정걸, 어영담, 이억기, 이운룡, 정사준과 함께 이봉수 장군이 <이순신을 도운사람들>에서 소개된 7人에 나온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조선수군의 화포장교에 공병장교 이봉수 장군이 나의 직계조상이라는 것을 오십넘어 알았다.
족보를 파보니 나의 13대 위 경주이 씨 애일당공파 조상이었다.
역사의 질곡을 살아온 뿌리깊은나무였다.

경주이 씨 애일당파 족보를 파는 맛이 갯것에 갯벌 맛 나는 남도음식의 찰진 맛이다.
큰 함지에 문사철(文ㆍ史ㆍ喆)을 버무려 문중에 大小家와 함께 노놔 먹는다.
음식도 그렇듯 재료(사실)에 양념(문사철)을 넣어 서로 비비고 부비면 새로운 맛(의미, 역사적 사실)이 나온다. 일단 큰함지 그릇에 담아 이것저것 재료와 양념을 넣고 정신사납게 덤벙덤벙 부비고 부벼야 새로운 의미와 맛이 나온다. 그 맛은 세상의 이치요, 우주의 진리인 것일가
족보를 알아가며 쓰는 글은 샘이 깊은 물이나 바다를 담은 그릇이라 해도 좋겠다.
나의 문중 묘비가 있는 고흥 두원면 운대리, 그곳에 고흥분청문화박물관에 있는 분청사기 그릇 이야기를 담은 동화 <바다를 담은 그릇>도 궁금하다. 아이들이 고흥에 뿌리깊은 나무 아래에서 그릇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릇이란 무엇인가?

덤벙대며 담갔다 꺼낸 덤벙 기술에 의해 만든 그릇이 그릇 중에 그릇인 분청사기라니, 왜구들이 훔치려고 그렇게 탐내던 그릇이라니 놀랍다.
과학적 사고에 길들여진 뇌로는 덤벙대다는 꼼꼼하지 못하다 정도로 해석된다. 글도 잘 정돈되고 뻔한 그릇에는 심심한 맛이 나온다.
덤벙(?) 대고 볼일이다.
덤벙에 담긴 인문학은 있는 그대로의 진솔함이었다.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니 고교 단톡방에 <나무는 나무라지 않는다> 아침편지가 올라왔다.
저자이름이 유영만이다.

나무가 그냥 생긴대로 나무라 하지, 왜 나무라 하지 않는 것인가?
나무(tree)는 나무(blame)라지 않는다는 말인가?
교수는 알겠고 지식생태학자란다.
고수와 한 끗 차이 교수는 알겠는데, 지식생태학자는 무엇인가?
아부지가 좋아하셨던 풍수지리, 음양오행, 명리학과 비슷한 것은 아닐까?
火 ㆍ水 ㆍ木ㆍ金ㆍ土 오행이 저마다의 물성을 가지고 있듯 十간과 十二지가로 육십갑자로 돌아가는 시간과 공간은 저마다의 운명(命理)을 지니고 있다.
아부지 그 말씀과 교수의 말씀은 무슨 차이일까?
자연의 섭리에서 세상사는 지식과 지혜를 배운다?
그렇게 그 정도로 이해하고 유영만 교수 말의 핵심만 붙여 넣고 넘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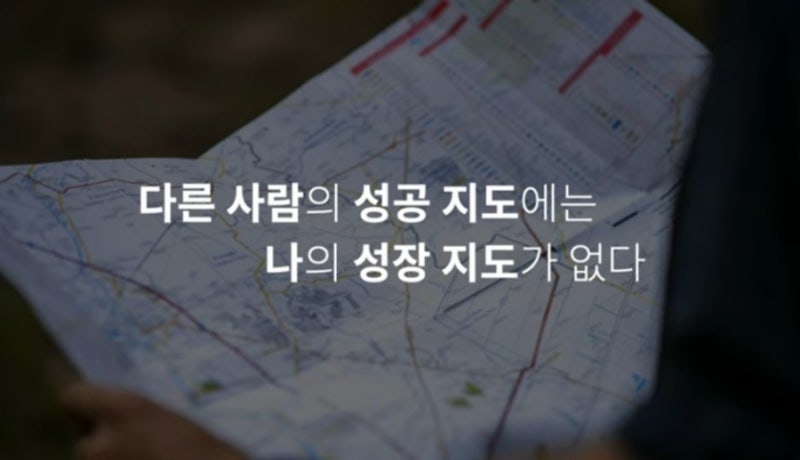

'그란디 = 나도 곰곰이 그렇게 생각해 보니'라는 뜻을 가진 다양성을 존중하는 뿌리깊은 남도 말이다.
그란디, 유영만 교수가 하는 말이 요즘에 내가 터득한 삶의 방식과 일단 비슷하다,
일단, 그란디다.
그란디, 코나투스(?)라는 라틴어는 금메말시다.
금메말시는 상대방의 말에 긍정을 하면서도 부정의 여지를 남겨 놓은 오밀조밀하고 웅숭깊은 말이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르겠다는 사람 속 같은 속 깊은 말이다.
이 나이에 대학원 가고 박사학위 받아 교수하기는 너무 늦었다.
늑깎이 라는 말도 있지만, 교수는 늦었고 고수나 꿈꿔본다.
무림고수는 어떠한가
남도여행의 무림고수~
'남도 알림이' 라는 말도 좋다.
하여간, 교수와 고수는 한끗 차이다. 교수들은 스토리텔링하는 데는 하여간에 똑소리 난다.
고흥과 고흐도 한 끗 차이다.
고흥에는 조선에 스토리텔링 대가 류몽인 대감이 살았다.
고흐 미술품도 동생 테오의 아내~제수씨 요한나 덕분에 빛을 보게 됐다.

낮과 밤이 빛나는 남도는 언제나 오려나~
고흐그림으로 스토리텔링하여 <고흐와 함께 떠나는 고흥여행>도 써봤다.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은 사시사철 빛나는 광양(춘색)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남도여행의 재미도 똑소리 나는 스토리텔링에 있다.
<남도와 사랑에 빠지는 인문학 여행>이다.
요즘에 여행고수들은 해외관광을 가지 않고 남도여행을 떠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남도관광을 남도여행으로 혁명할 만한 여행고수 고재열 감독과 함께한 여수와 고흥여행도 새로웠다. (高)품격 (興)미로운 高興여행이었다.
인생은 여행이다.
인생길도 여행길이다.
나는 어떤 나무에게 길을 묻고 살아가면 좋을까?

주말에는 시산제에 간다.
동창이 아짐찬하게도 시산제에 홍어무침을 선물했다.
남도 향우회나 시산제를 가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시기 홍어와 홍어무침이다.
그렇다.
홍어처럼 살아도 좋겠다.
내면이 푹~사쿼지고 숙성된 홍어처럼 살아도 좋겠다.
홍어 내음새 나는 나무는 무엇이 있을까?
한붓 한다는 동창이 시산제에 쓰라고 축문을 선물로 보내왔다.

고흥 동강과 순천벌량에 있는 첨산을 올라볼까?
그 붓끝이 딱~흥양의 선비들이 과거 보러 갈 때 넘어가는 비암재~ 뱀골재가 있는 고흥 동강의 옛 이름 대강, <大江의 筆峰>이다.
대강(?) 쓴 필체가 아니다.
첨산의 인문학이 붓끝에서 묻어난다.
石峰에 버금가는 筆峰 이종기 선생이라 할만하다.


사람냄새 나는 나무는 또 무엇이 있을까?
교수의 나무에는 나로도 쑥섬에서 보았던 남도의 후박나무가 없다.
이보다 어머니 닮은 나무가 또 있으랴~

교수에 나무에는 시골마을 놀이터(동각)에서 보았던 팽나무와 느티나무가 없다. 동산에서 보았던 느릅나무도 없다.
팽나무와 느티나무는 개나무라 하고 감나무는 개암나무라 할매가 그랬다.
강단의 나무에는 개나무와 개암나무도 없다.
개암나무에서는 까치가 까치밥을 먹었다. 할매는 까치가 한 개 남겨두면 서운하랴~
한사코 두어세 개 남겨두었다.

사람 내음새 나는 나무는 또 무엇이 있을까?
큰학교 강단의 나무에는 깨똥나무 라 불리는 누리장나무가 없다.
그만의 독특한 향을 풍기는 누리장 나무다.

順天에도 있고 광명에도 있는 삼산에서 보았던 누리장나무다.
누리장나무는 남도의 무림고수(?)에 詩에 나온다.
누리장나무를 오십넘어 처음 알았다.
누리장나무에도 잎사귀에도 민달팽이 지나간 흔적이 있다고 시인은 말한다.
<길>은 믿음이요 축복이라는 말에 무슨 역사의 뿌리가 심어져 있을까?

<나무는 내 운명> 일지도 모른다.
'꿈의다리'가 있는 순천만정원으로 옮겨진 저 소나무처럼 고흥에서 순천으로 옮겨져 자란 나무 일지도 모른다. 막걸리를 뿌리에 부우니 뿌리가 뽑혀 순천만정원으로 옮겨진 순천상사 소나무와 별량 모과나무가 떠오른다. 나무는 헬기랑 불도저 타고 나는 동방(교통)타고 순천으로 갔다.

천 그루의 나무를 심는 운명이었다는 李千植 남도의 무림고수에게 물어볼 일이다.
그러고 보니, 고수의 책에는 오얏나무(李)가 있다.
순천만정원으로 굴착하여 옮겨진 뿌리깊은 나무이야기다.
올해는 열심히 산에 올라 나무에게 길을 물어보련다.
나무에게 묻다 보면 그게 메아리처 숲이 되고 山이 되지 않겠는가.

시산제에 가서 산신령에게 물어봐야겠다.
빌지만 말고 물어봐야 겠다.
조상들도 질곡의 삶을 사느라 피곤했는데 죽어서 까지 빌기만 하니 영혼이 피곤 할수도 있겠다.
빌지 말고 여쭤봐야겠다.
조상에 묘비와 흔적과 역사가 있는 산에 올라 물어봐야 겠다.
山에게 인생 길을 물어봐야 겠다.
'역사란 과거와 미래의 끊임없는 대화' 라는 말 좋다.
나의 뿌리 조상과 먼저 대화해 봐야겠다.



'여행 > 남도여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돌文語>칼럼여행 ; 남도 순천고와 서울 진명여고, 그리고 진명이란? (10) | 2025.05.31 |
|---|---|
| 남도 우렁각시와 대금이 누나 (2) | 2025.04.30 |
| 나의 족보유산 답사기행 6 ; 문중묘비 속에 역사는 흐른다 (0) | 2025.03.05 |
| 나의 족보유산 답사기행 4 ; 영화 속에 족보는 흐른다 (1) | 2025.02.27 |
| 나의 족보유산 답사기행 2 ; 족보 속에 역사는 흐른다 (2) | 2025.02.24 |